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넘어선 음악적 성취
2024년 4월 12일, 일본 록 밴드 Mrs. GREEN APPLE이 발표한 디지털 싱글 「ライラック」은 TV 도쿄 계열 애니메이션 『忘却バッテリー』의 오프닝 테마곡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 곡은 단순한 타이업 곡의 범주를 뛰어넘어, 음악성과 대중성 양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발매 직후 주요 음악 차트를 석권했을 뿐 아니라, 제66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2024년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서정성의 심화: ‘답가’로서의 정체성
보컬이자 작곡가인 오오모리 모토키는 본 곡을 과거의 대표작 「青と夏」에 대한 일종의 ‘답가’로 언급한 바 있다. 「ライラック」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감정,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성숙한 시선이 중심을 이룬다. 청춘을 단지 젊음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곡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
가사는 봄의 꽃인 라일락을 모티프로, 찬란했던 시절의 한순간을 상징화한다. 그 시절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이들이 느끼는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려는 섬세한 감정이 시적으로 표현된다.
음악적 회귀와 밴드 사운드의 재구성
「ライラック」은 Mrs. GREEN APPLE이 최근 몇 년간 시도해 온 오케스트라 중심의 스케일 있는 편곡에서 벗어나, 록 밴드로서의 원형적 사운드로 회귀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복잡한 구조의 기타 리프와 살아 있는 리듬은, 그들이 밴드로서 지녔던 초기의 에너지와 충동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오오모리 자신이 학창 시절 카피 밴드 활동을 통해 느꼈던 감각을 재현하고자 했다는 고백은, 이 곡이 단순한 복고가 아닌 ‘창작의 기원에 대한 반성적 탐색’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음악적 선택은 곡의 메시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청춘의 본질적 에너지와 그것을 둘러싼 감정의 미묘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시청각적 완성도와 대중문화적 파급력
「ライラック」은 음악뿐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공식 뮤직비디오는 곡의 정서와 내러티브를 고밀도로 시각화하고 있으며, MTV VMAJ 2024에서 ‘Best Group Video’, ‘Best Art Direction Video’, ‘Best Cinematography’ 부문을 수상하며 그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곡의 시각적 보조를 넘어, 음악 자체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하나의 독립적 서사로 기능하고 있다.
방송을 통한 무대 연출 역시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뮤직스테이션’, ‘CDTV 라이브! 라이브!’ 등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일관된 콘셉트 연출은, 곡의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상과 기록: 대중성과 작품성의 교차점
음악 산업 내에서의 성과 역시 이 곡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발매 후 Billboard JAPAN의 Hot 100, Download Songs, Streaming Songs 부문에서 모두 주간 1위를 차지했고, 스트리밍 누적 1억 회를 최단 기간 내에 달성했다. 또한, 제66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년도 수상작인 「ケセラセラ」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는 밴드로서는 최초의 연속 수상이며,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레코드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2020년의 「炎」 이후 4년 만으로, 그 상징성 또한 크다.
결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현대적 청춘의 초상
「ライラック」은 과거와 현재, 청춘과 성숙, 개인적 감정과 대중적 공감의 접점에서 탄생한 곡이다. Mrs. GREEN APPLE은 이 곡을 통해 밴드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으며, 청춘이라는 보편적 테마를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곡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잊혀지기 쉬운 감정의 파편들을 섬세하게 붙들어내며, 그것을 공감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낸 데에 있다.
라일락이라는 꽃말처럼, 「ライラック」은 지나간 계절 속에서 피어났던 감정의 향기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는 서정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기억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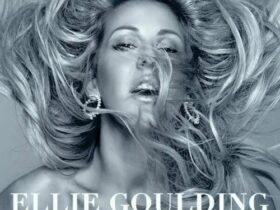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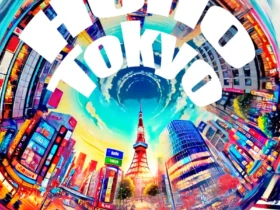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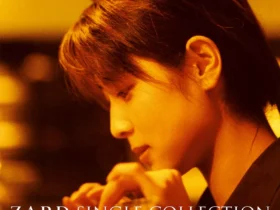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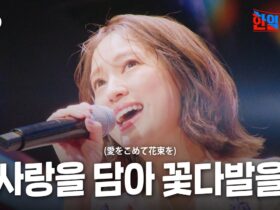




Leave a Reply